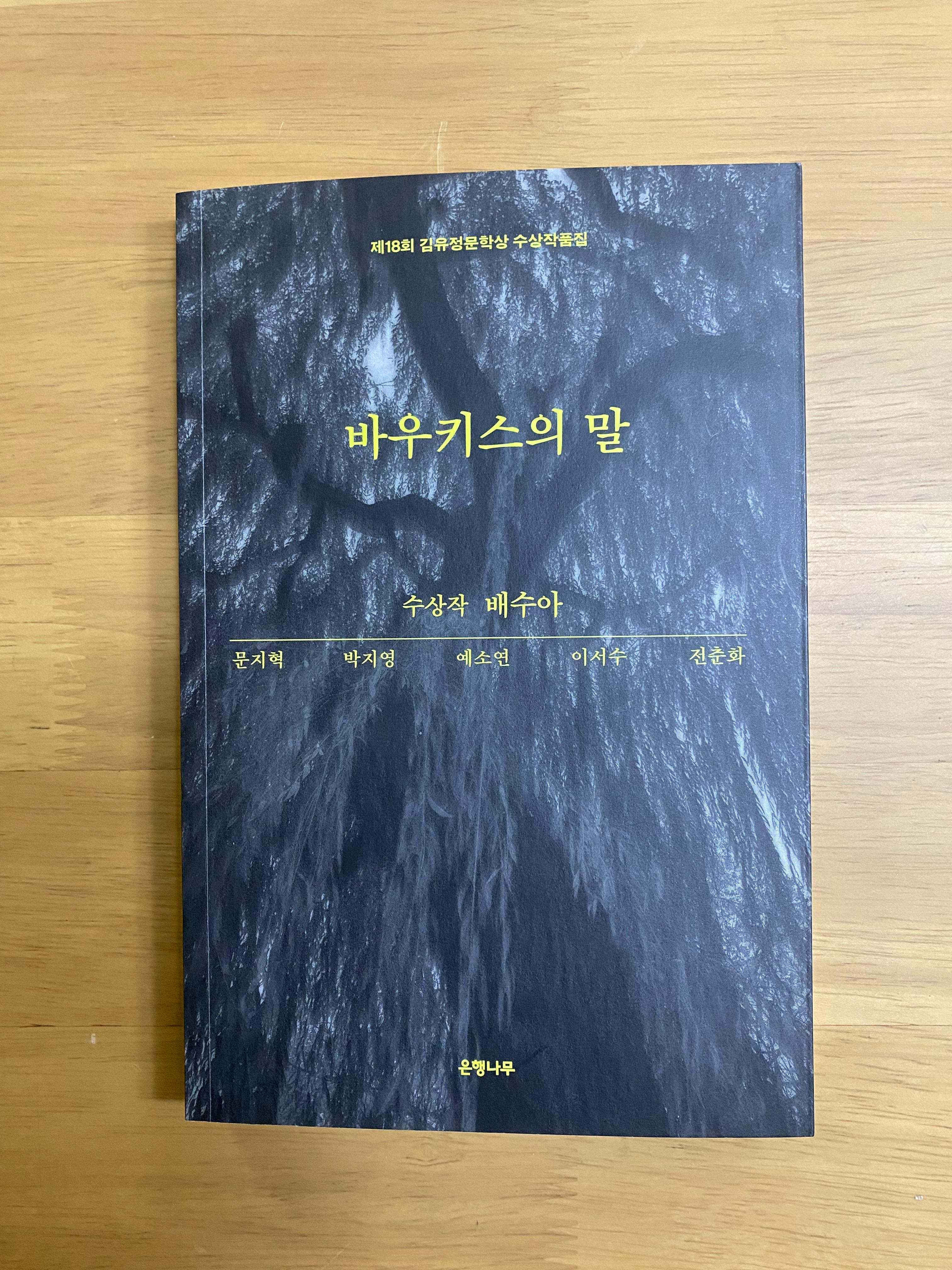
"이승과 그리 멀지 않은 저승 끝에 다다랐을 때 아내를 잃을까 봐 겁났던 오르페우스는 못 참고 고개를 돌려서 그녀가 뒤에 오는지 봤다. 아내는 팔을 뻗어 남편을 안으려 했지만 그 안타까운 손은 허공만 잡을 뿐. 다시 죽은 그녀는 남편을 탓하지 않았다. 사랑이 무슨 죄겠는가? 그녀는 그에게 닿을 수 없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다시 저승으로 내려갔다... "(영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중에서)
셀린 시아마 감독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을 본 후 나는 배수아의 《바우키스의 말》을 떠올렸다. 아니다. 배수아의 《바우키스의 말》을 읽고 무엇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최근에 본 그 영화가 떠올랐다는 게 맞는 말이다.(물론 선후 관계가 중요하지는 않다. 중요한 게 있다면 영화가 소설을, 소설이 영화를 생각나게 했다는 사실이다.) 실은 영화에 대해서도, 소설에 대해서도 딱히 무언가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문득 생각난 하나의 단어 혹은 스치듯 떠오른 어떤 생각 때문에, 영화에 대해서도, 소설에 대해서도 쓸 엄두가 생겼다고 해야 하리라.
그렇듯 문득 생각난 하나의 단어는 '말'이었고, 스치듯 떠오른 어떤 생각이란 '마지막'이라는 것이었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에서 주인공인 엘로이즈는 연인인 마리안느, 하녀인 소피와 함께 에우리디케와 오르페우스의 이야기를 읽으며 대화를 나눈다. 《바우키스의 말》에서 화자는 필레몬과 바우키스의 이야기를 한다. 둘은 물론 다른 이야기지만 어쩌면 마지막 순간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서로 같은 이야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서로 헤어져야만 하는 순간에 연인의 입에서 마지막으로 발설되는 단 하나의 말은 무엇이었을까.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은 그것을 이렇게 상상한다. 영화 속 엘로이즈의 말처럼, 오르페우스가 돌아본 이유가 다름 아닌 에우리디케의 마지막 말이었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에우리디케는 오르페우스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른다고.
'뒤돌아봐요‘
하지만 《바우키스의 말》에서 작가는 점차 나무가 되어가는 필레몬이 바우키스에게 하는 마지막 말을 상상하기 위해 말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말이라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세계를 들여다본다. 짐작해 본다. 상상해 본다. 느껴본다. 그러니까 소설의 시작 부분에 나오는 에즈라 파운드의 말과도 같이.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오직 바람이 말하게 하라.'
우리는 숲을 산책하다가 마주친 두 그루의 나무를 각자 껴안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나무를 포옹한 자세로 서로 움직이지 않았다. 마침내 단단한 껍질 아래서 나무의 떨리는 내면이 느껴질 때까지. 마침내 입 없이도 하나의 어휘가 저절로 말해질 때까지.(36쪽)
하지만 마지막 말을 상상하기 전에, 그 말이 무엇이든 간에, 필레몬과 바우키스가 서로에게 한 그 말을 누군가(혹은 무엇인가)는 듣지 않았을까? 작가는 그렇듯 '바우키스의 말'을 쓰기 위해, '가장 마지막 구절로만 이루어진 하나의 단편'을, '최후의 순간에 말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쓰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내 음악은 그 바우키스의 변신의 순간에 그녀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들에 귀 기울이기입니다. 그 순간을 이루고 있던 오래된 소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한번 공명한 소리는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예를 들자면 그것은 가을이었을까. 강물은 어떤 소리를 냈을까. 그리고 바람은. 돌은. 마지막 편지의 말은. 붉은 가을이었을까. 최후의 순간 바우키스의 입에서 나온 말은.(52쪽)
그리하여 작가는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쓴다, 지금 여기에 없는 것들을 향해 귀 기울이면서.(16쪽)
근래에 읽은 소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단편이었다. 그렇게 배수아의 세계는 넓고도 깊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
'흔해빠진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 불완전한 세계에서 (2) | 2025.02.06 |
|---|---|
| 울고 실망하고 환멸하고 분노하면서, 다시 말해 사랑하면서 (0) | 2025.02.02 |
|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0) | 2025.01.05 |
| 바서부르그의 열흘 (0) | 2025.01.01 |
| 모든 별은 태어나서 존재하다가 죽는다 (2) | 2024.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