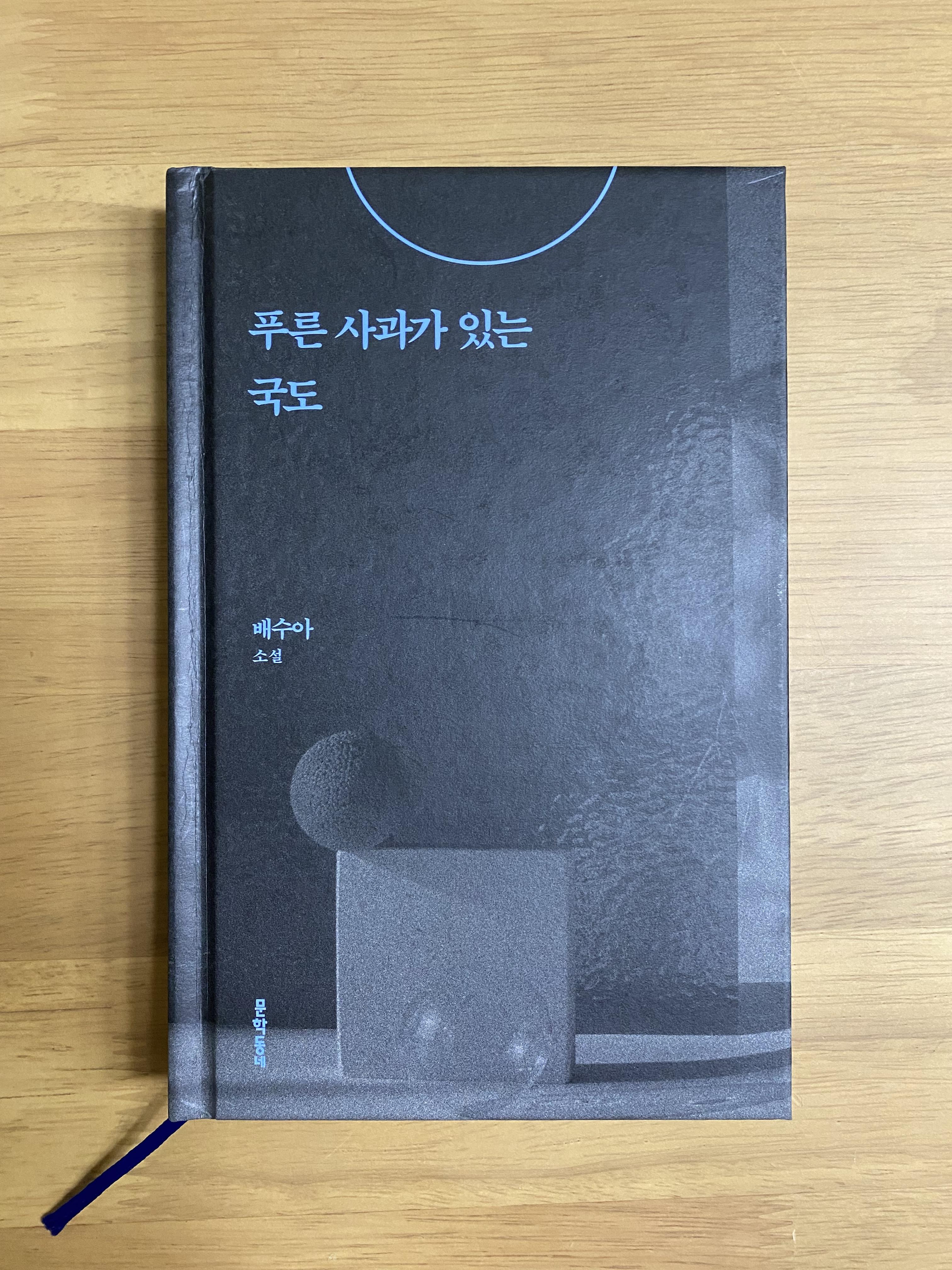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단 한 줄의 문장도 쓰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거의 그것을 잊은 채로 지내더라도, 언젠가는 책이 먼저 말을 걸어줄 것임을 이제는 믿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때까지 조바심 내지 않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다. 거의 그것을 잊은 채로.
*
나는 저 문장을 에두아르 르베의 『자화상』을 읽은 지 7년 만에 썼다. 처음 읽고 나서는 단 한 줄의 문장도 쓰지 못했지만, 무슨 조화인지 무려 7년 만에 나는 그 소설이 다시 생각이 났고,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쓰게 된 것이다. 그 책처럼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나는 배수아의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를 올해 초에 읽고 지금까지 어떤 말도 쓰지 못했다. 『자화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이 책을 내 책상 위 보이는 곳에 늘 놓아두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나는 기다렸다. 책이 말을 걸어주기를.
그러다 불현듯 아, 그래 그것을 쓰면 되겠구나 생각했다. 떠오르는 것이 단 한 줄의 문장이라면, 그 단 한 줄을 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떠오른 것은, 시고 떫은 사과를 한 입 베어 문 자리에 고인 붉은 피였다. 부지불식간에 피부를 벤 날카롭고 쓰라린 감각이었다. 시리고 아린, 아직 덜 여문 사과와도 같은, 젊은 날의 혼돈이 소용돌이치는 그런 세계였다.
소설 속 구체적인 이야기는 생각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뭉개지고 희미해졌다. 내게 남은 것은 오로지 그런 몇 개의 문장들, 이미지들, 감각들 뿐. 나는 그것들을 논리 정연한 문장으로 길게 표현할 수 없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책이 가진 '마력'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든 것이다. 혹은 나는 더 이상 이 책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고 말할 수밖에.
한 가지 더.
이 책에 실린 소설들의 제목을 말해볼까.
푸른 사과가 있는 국도.
1988년의 어두운 방.
엘리제를 위하여.
여섯번째 여자아이의 슬픔.
아멜리의 파스텔 그림.
인디언 레드의 지붕.
검은 늑대의 무리.
어쩌면 저 제목을 호명하는 것만으로도 이 소설을 감싸고 있는 비의(秘義 혹은 悲意)에 이미 조금은 다가간 것이 아닐까.
'흔해빠진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간에게 또 어떤 다른 속이 있었던가?(최열, 『권진규』, 마로니에북스, 2011.) (0) | 2023.01.09 |
|---|---|
| 작지만 확실한 위로(윤성희, 『날마다 만우절』) (0) | 2022.12.17 |
| 슬프지만 슬프지만은 않은 (0) | 2022.08.21 |
| 부엉이에게 울음을 (0) | 2022.08.08 |
| 날것의 무언가가 나를 치고 가기를 (0) | 2022.0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