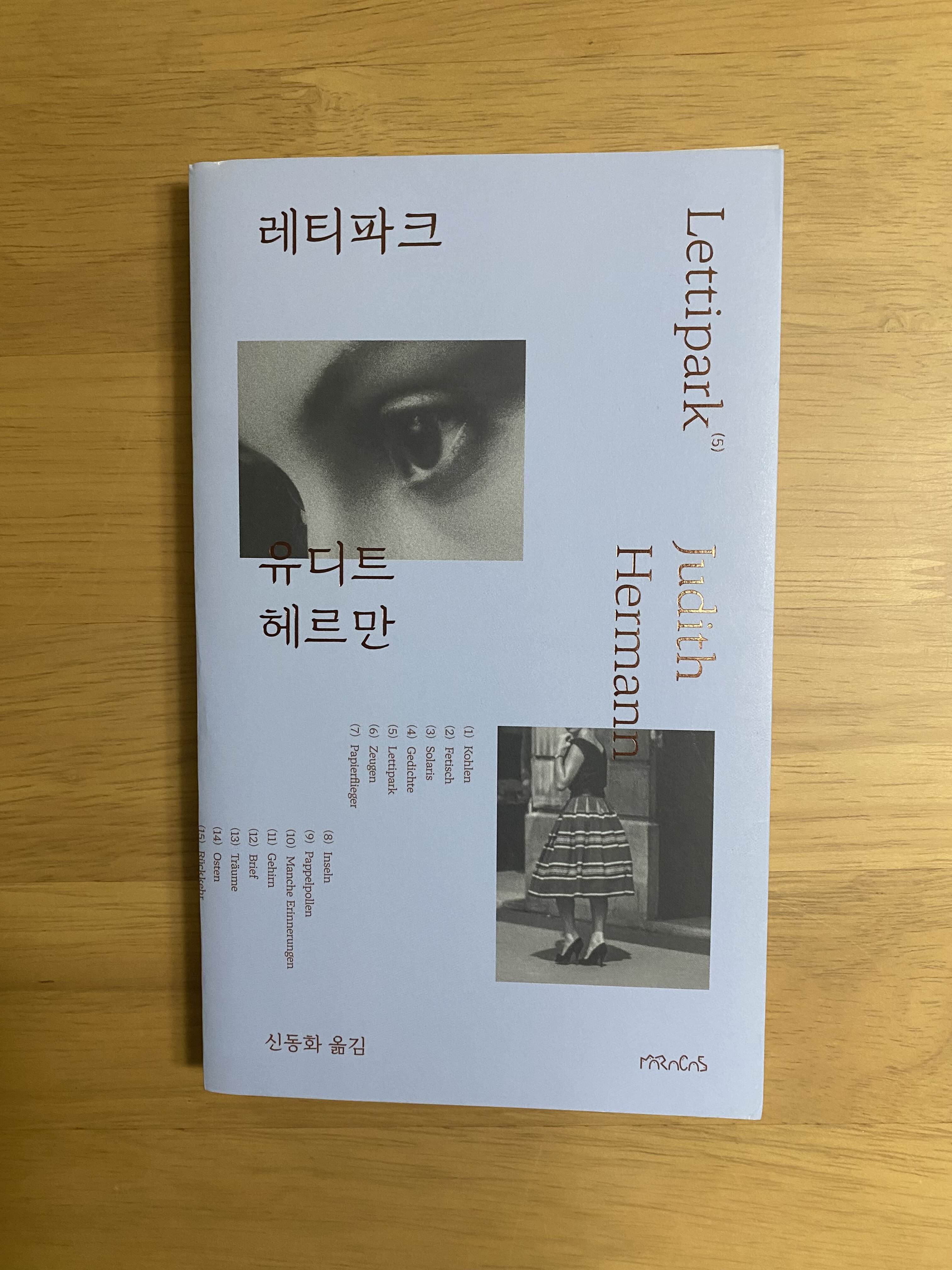매혹이란 무엇일까. 알다시피 그것은 불능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존재의 자율을 상실하고, 마음의 근육이 녹아내리고, 액체에 가까운 모습이 되어 보이지 않는 물길 따라 한없이 흘러가버리게 되는 것. 그리고 그 이전으로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것.(김선오, 『미지를 위한 루바토』 중에서) *내가 김선오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것은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잡지(?) 혹은 쇼핑몰(?)(사이트의 정체성을 아직도 잘 모르겠다)에 실린 그의 인터뷰에서였다. '나는 사치스럽게 잔다'라는 제목의 인터뷰였는데, 그전까지도 나는 김선오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랬으므로 당연히 그가 시인인지도 알지 못했으며, 심지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짧다면 짧은 인터뷰에서 그의 생각과 언어가 너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