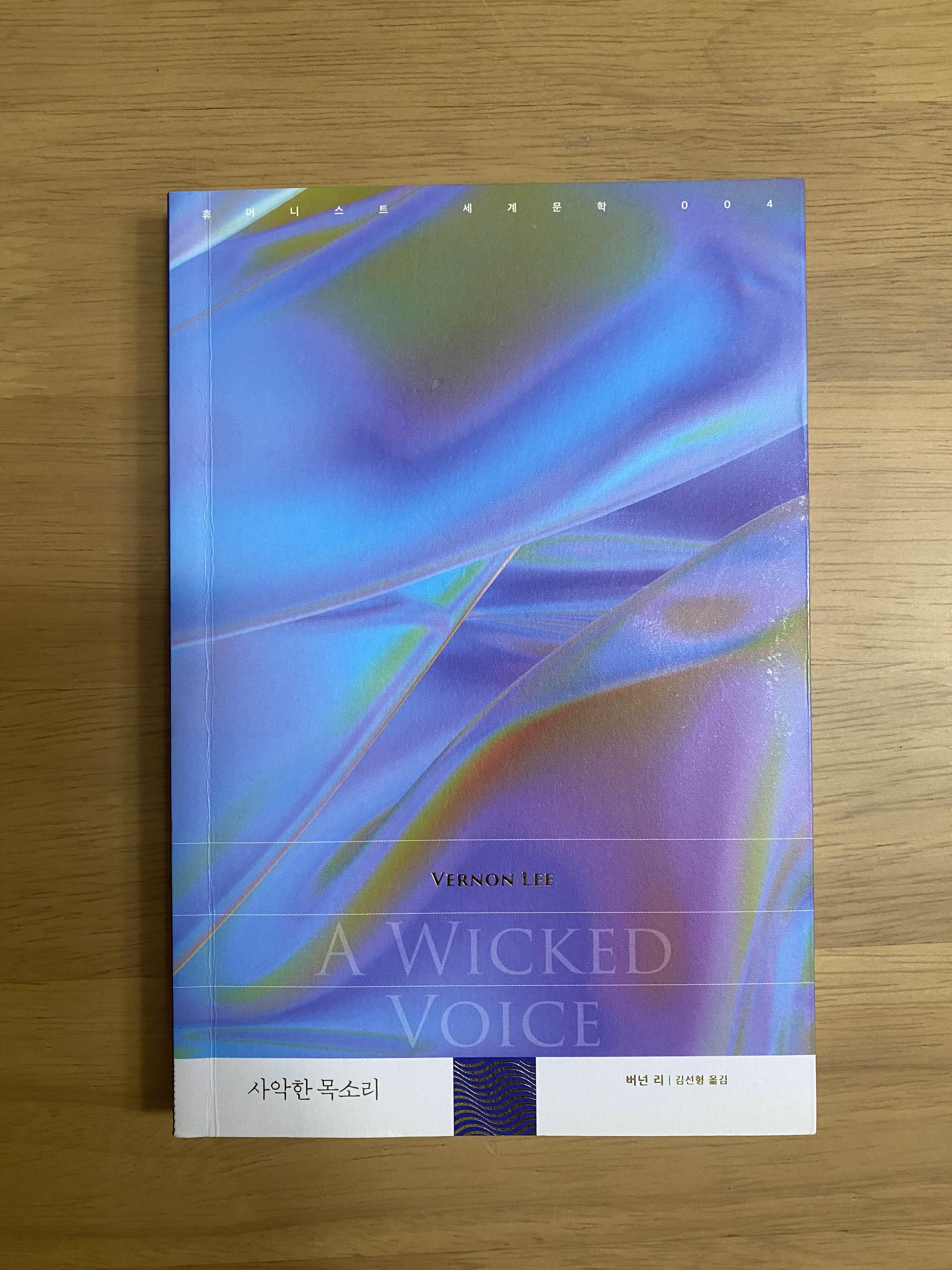
베일처럼 덧씌워진 타자의 정체성, 끝없이 현재를 침습하는 과거, 기억의 유령. 반듯한 정상이라 이름한 양태는 너울처럼 덮쳐오는 불안한 이질성에 일그러지고 휘어져 섬뜩하게 낯선 이면을 드러낸다. 인식의 낙차에서 탄생하는 새롭고 섬뜩하고 무서운 것들은 위험하고 또 매혹적이다.
- 버넌 리, 『사악한 목소리』 중 옮긴이 김선형의 해설 중에서
*
생소한 작가의 작품을 읽는 일은 언제나 설렌다. 이번에 읽은 버넌 리라는 작가의 작품도 그랬다. 제목 또한 '사악한 목소리'가 아닌가. 유혈이 낭자한 호러 소설은 아니지만, 여름에 어울리는 소설이 아닐까 싶다. 내가 이 길고도 긴 여름의 뜨거운 습도를 견디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이 소설이었으므로.
세 편의 소설 모두 공통적으로 보이지 않는 존재(<유령 연인>에서는 과거에 집안사람과 관련된 어떤 인물이, <끈질긴 사랑>에서는 역사학자가 자신이 연구하는 역사 속 팜므파탈적 여인에게, <사악한 목소리>에서는 성악가에 대한 혐오를 가진 뮤지션이 과거에 있었던 성악가의 목소리)에 영향을 받거나 소위 빙의된 인간들이 나온다.
유독 어떤 이들에게만(그들은 선택된 존재들일까? 그렇다면 무엇에? 아님 보이지 않는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들일까?) 보이거나 들리는 존재가 있다. 그들을 둘러싼 인물들은 모두 그들을 보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실제로 보고 듣고 만진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현실이자, 환희이며, 매혹이자, 고통이며, 죽음이다.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닌 존재들에게 현혹되거나 빙의되거나 매혹된 자들의 결말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비극성을 띤다. 그렇지 않겠는가? 자신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환희에 찬 현실이라 하더라도, 현실 세계에서 그것들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므로.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그러한 허상 속에 살게(혹은 죽게) 되었다면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해피엔딩인 걸까? 어느 입장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비극도 되고 희극도 되는 것일까? 보다 중요한 것은, 소설의 끝에 실린 김선형의 해설에서도 언급된, '인식의 낙차에서 탄생하는 새롭고 섬뜩하고 무서운 것들은 위험하고 또 매혹적'이라는데 있다.
나는 그 매혹에 주목한다. 어쩌면 이 소설은 미스터리 한 호러 소설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상당히 매혹적인 사랑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치명적인 것을 품고 있지 않은 매혹이란 그리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므로.
'흔해빠진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무도 그리워하지 않을 그 여자에 대하여 (0) | 2024.10.20 |
|---|---|
| 속삭임 우묵한 정원 (0) | 2024.09.25 |
| 쓸 수 없음에 대해 쓰기 (2) | 2024.08.10 |
| 낮의 빛은 그 꿈들을 쫓아낼 수 없다 (0) | 2024.07.17 |
| 그것은 사랑이었을까 (0) | 2024.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