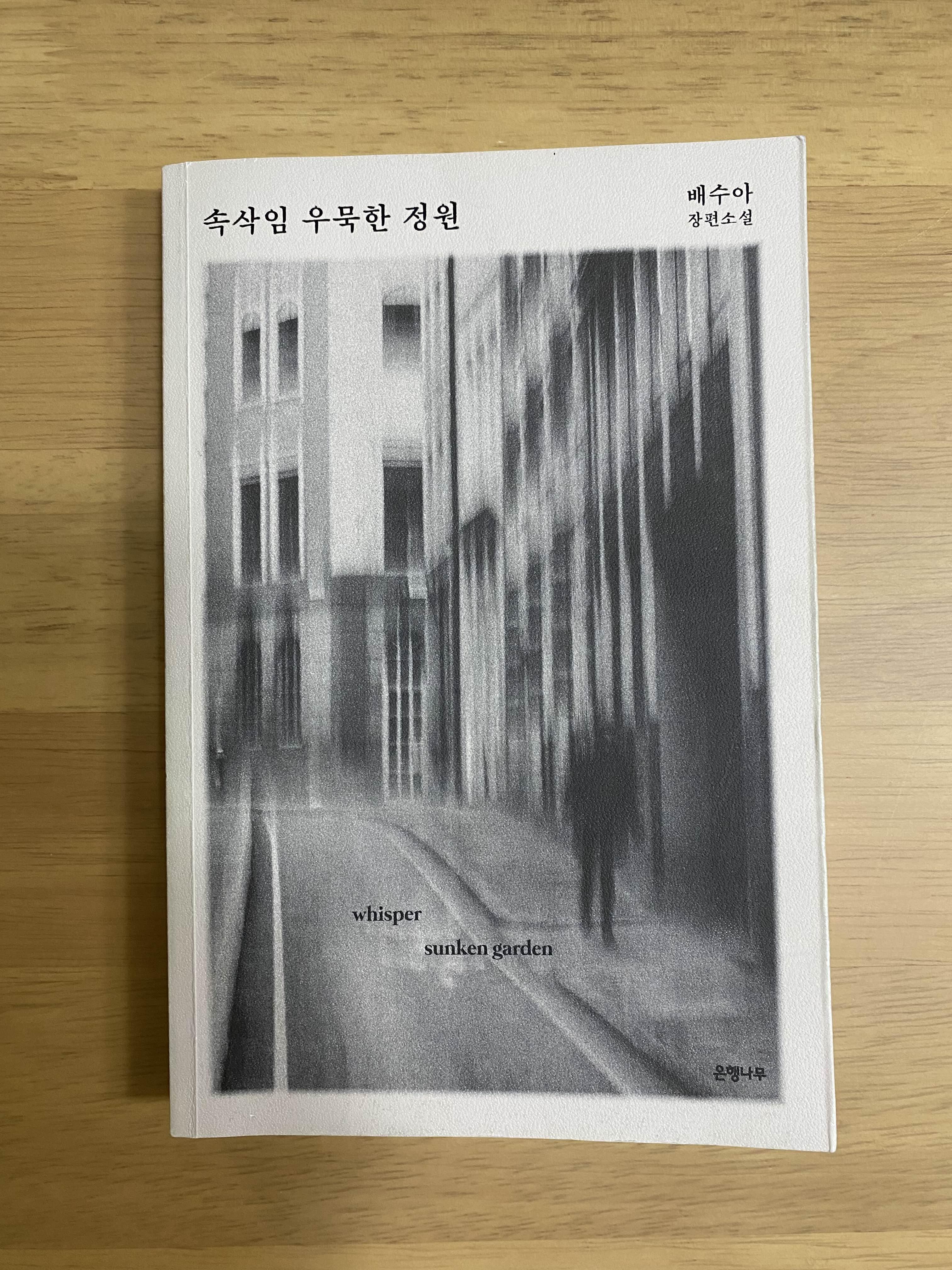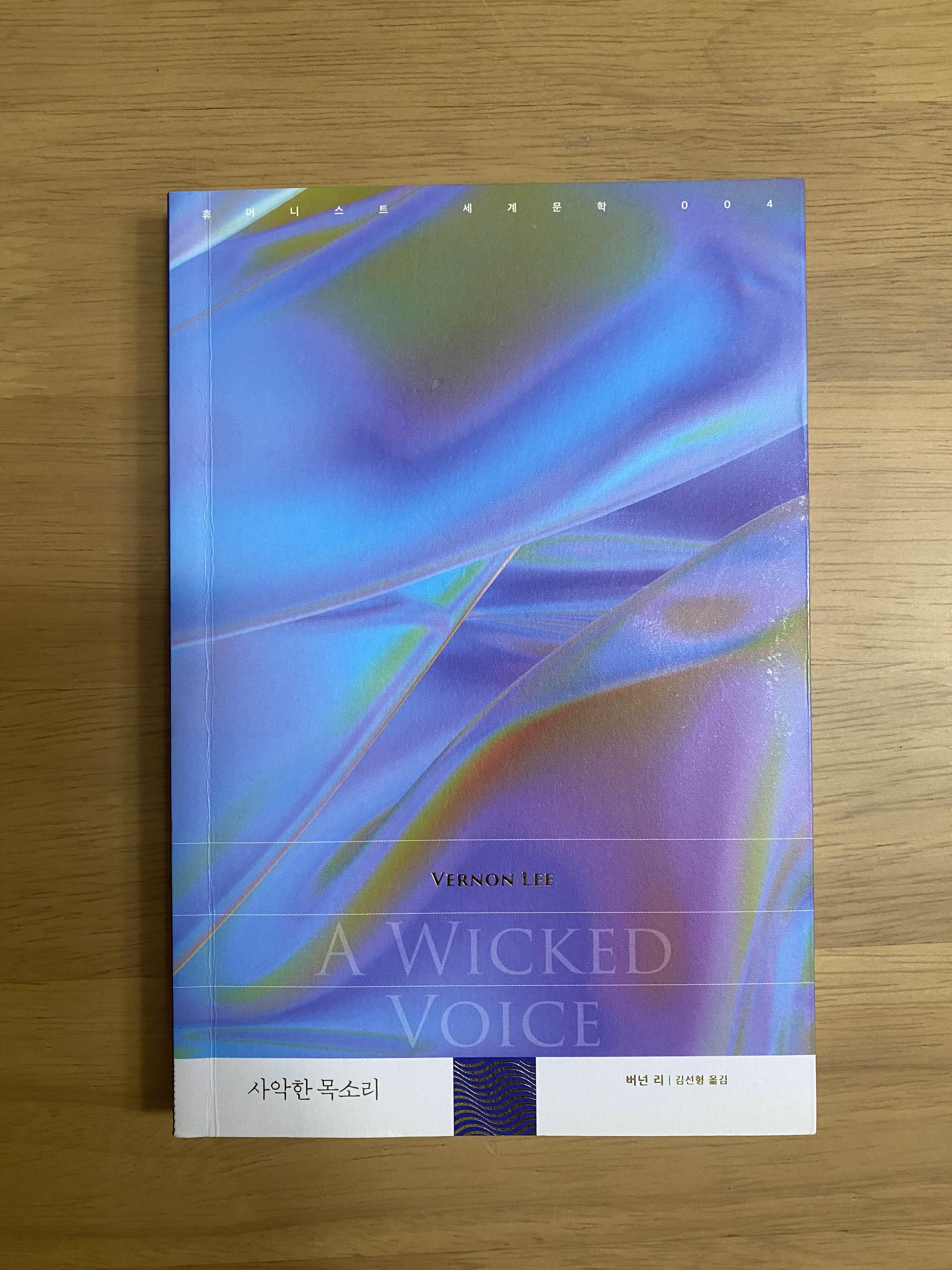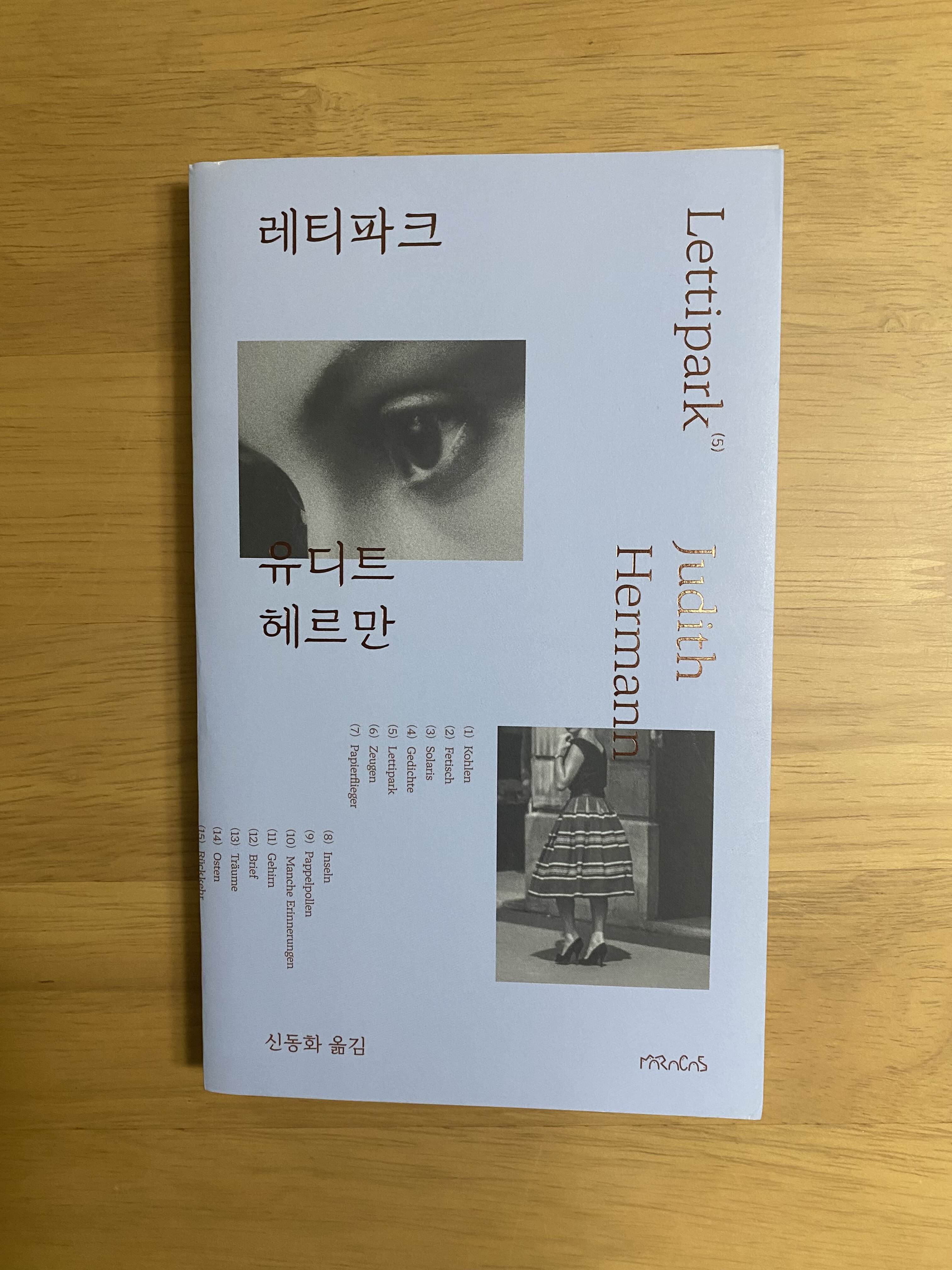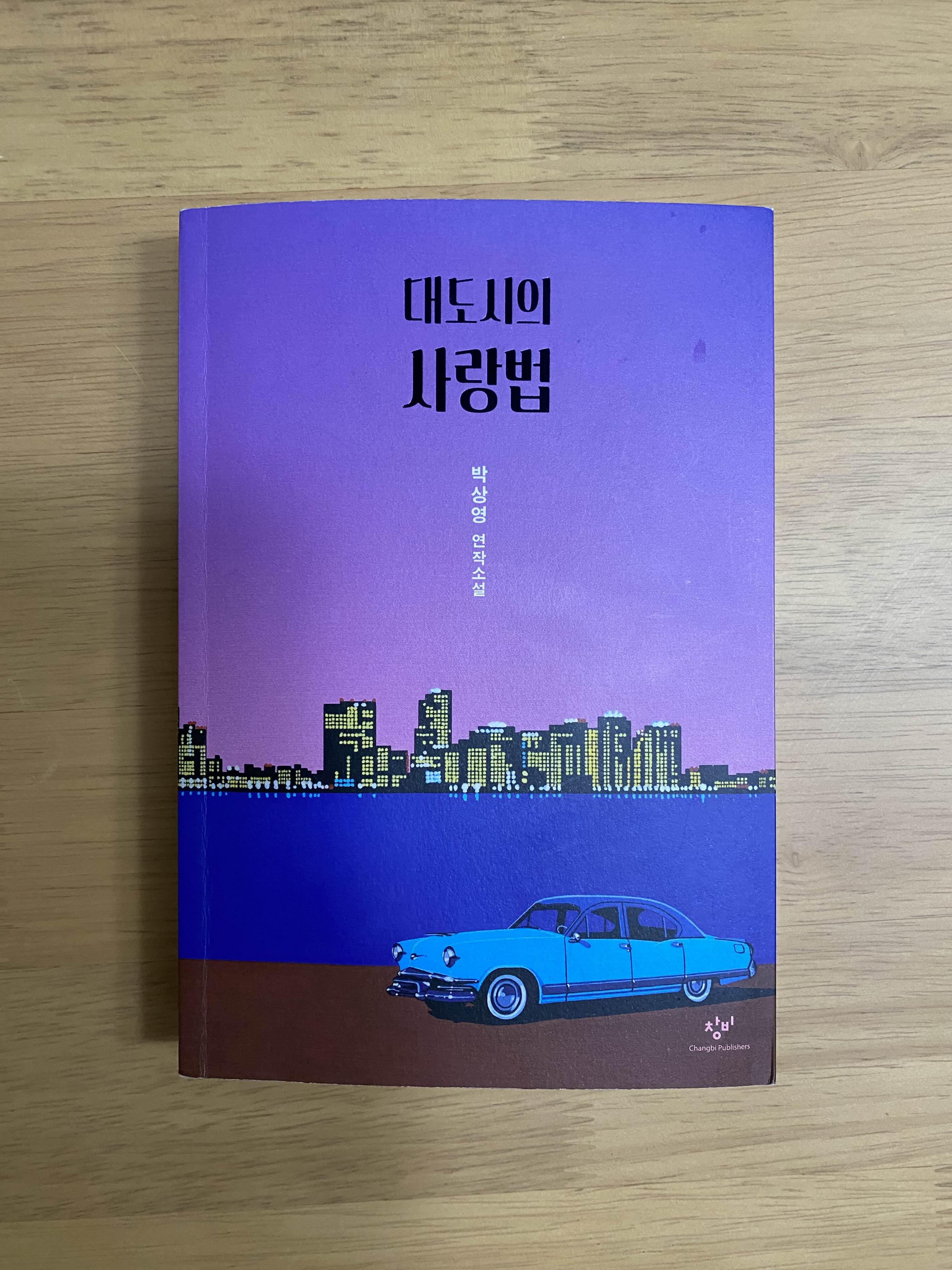클라리시 리스펙토르의 『별의 시간』을 읽고 감상문을 쓴 후, 우연히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와 관련한 유튜브를 보았다. 과거 방송작가였다고 밝힌 유튜버는 한강의 오랜 팬이고, 자신의 방송에 한강 작가가 나와서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한강 작가의 책을 소개하며 한 대목을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 역시 깊은 인상을 받았던 『바람이 분다, 가라』의 한 구절이었다. 모든 별은 태어나서 존재하다가 죽는다. 그것이 별의 생리이자 운명이다. 인간의 몸을 이루는 모든 물질은 별로부터 왔다. 별들과 같은 생리와 운명을 배고 태어난 인간은 별들과 마찬가지로 존재하다가 죽는다. 다른 것은 생애의 길이뿐이다.(17쪽) 그가 읽어주는 저 대목을 들었을 때, 나는 무언가 찌릿한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