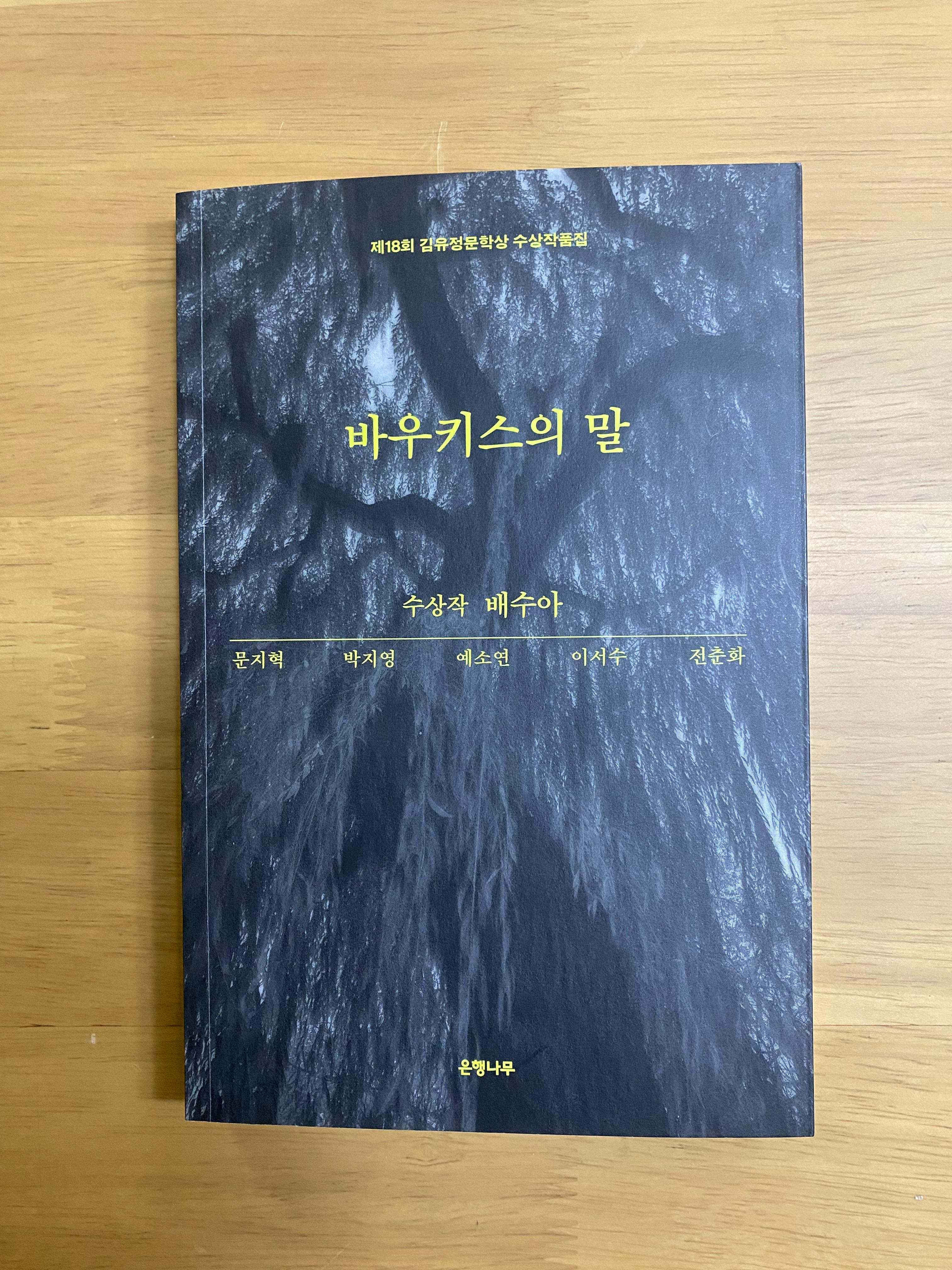"상처받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고립됐다는 것 아닙니까?" 강연에서 누군가가 인간관계에 상처받지 않는 법이 있느냐는 물음에 슬라보예 지젝이 한 말로 보인다. 영상으로 본 것은 아니고 한 장의 사진으로 보았다. 마치 인용하듯 잘라낸 한 장의 사진으로. 그 한 장의 사진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법이 있는가에서부터, 완전히 고립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떤 의미이며 그것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가... 완전한 고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은둔수사처럼 속세와의 인연을 끊지 않는 이상. 만약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번뇌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관계와 그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처. 고독이..